[스크랩]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시/ 유종화 작곡/ 김원중 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김 원중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도 눈물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김원중은 가수의 호흡을
무척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호흡까지 느껴지는 믹싱포인트를 요구한다. 김원중은 또 노랫말을 중시하는 가수이다. 모든 노래의 판단의 기준을
'노랫말이 잘 들리는 것'에 둔다. 그것이 용납되지 않으면 과감히 거절한다. 음악의 양식이나 스타일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의 음악은
목소리보다 반주가 크고 노랫말보다는 음악적 장치가 더 돋보인다. 그게 주된 흐름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음악적 소신을 고집하는 한 이러한 현실에
역류하는 외로움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답게. 당당하게. . . .
김원중의 두번째 매력이다.
"음악은 네 맘대로 해라. 무조건 따라가마" 역시 그 다운 주문이다. 군살이
없다. 실제로 그랬다. 후배의 단도리에 원중 형은 무척 고생했다. 본인에게 전혀 새로운 시도들, 본인에게 다소 어색한 모던스타일의 사운드로
인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번도 자기주장을 고집하거나 주저한 일이 없었다. 처음 내게 한 약속을 그는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일이 끝나고 보니 내 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전부 김원중이 원한대로 음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는 모두 김원중에게 익숙해 져야 했고 어색한 것은 모두 절제되었다. 오로지 '김원중'만 돋보였다. . . .김원중의 세 번째
매력이다.
나는 궁금하다. 그의 이러한 매력, 그 '마력'의 출처가 무엇인지. -류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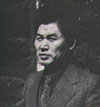 <직녀에게>라는 나의 통일염원을 읊은 서정시는 70년대 중반쯤 <심상>이라는 시 전문지에
발표한 작품으로 1981년 창비사에서 간행된 <땅의 戀歌>란 시선집에 실려 있다. 이 시가 노래로 작곡되어 불리워진 사연은 다음과
같다.
<직녀에게>라는 나의 통일염원을 읊은 서정시는 70년대 중반쯤 <심상>이라는 시 전문지에
발표한 작품으로 1981년 창비사에서 간행된 <땅의 戀歌>란 시선집에 실려 있다. 이 시가 노래로 작곡되어 불리워진 사연은 다음과
같다.
1980년 5월 이후 검거망을 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의 청탁에 의해
내가 84년 제 3세계 예술제가 열리는 서독 베를린에 들렀다가 거기서 뜻있는 해외동포로부터 이 노래의 악보와 육성으로 부른 테잎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 노래가 국내에서도 불리워지기를 바라고 당시 전남사대 영문과를 나왔으나 딴따라 기질이 있어 방송계로 진출한 애제자 오창규군에게
건네어 주었다.
오창규는 그것을 다시 역시 교단을 버리고 통기타의 반려자가 된 노래꾼 박문옥에 건네었다. 해외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곡풍인데다 국내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판단, 일면 작곡에 대한 야심도 있었던지, 그 동일 가사에다 다른 곡을 붙였다.
그리하여 새로
탄생한 민중가요 <직녀에게>는 당시 <바위섬>이라는 노래로 한창 방송가의 인기를 타고 있던 신선한 목소리의 대학생 가수
김원중을 만나 음반으로 취입되었다. 그 노래는 서서이 반향을 일으켜 <바위섬>의 여운을 이어받는 듯했으나 작사자인 내가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반체제 운운하는 원동권 재야 세력 탓인지 방송가의 전파에서 조금씩 밀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 노래는 김원중의 열창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현장에서 민중가수의 상징적 애창곡이 되어 이 시대의 대표적 통일염원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분단 반세기를 넘긴 이 시점에서 김원중의
<직녀에게>는 남북한 구석구석까지 울려퍼져 이 땅의 통일을 앞당겨올 것이며,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그의 절규는 온 누리에 메아리칠
것이다.
- 문병란 / 시인, 조선대 교수

